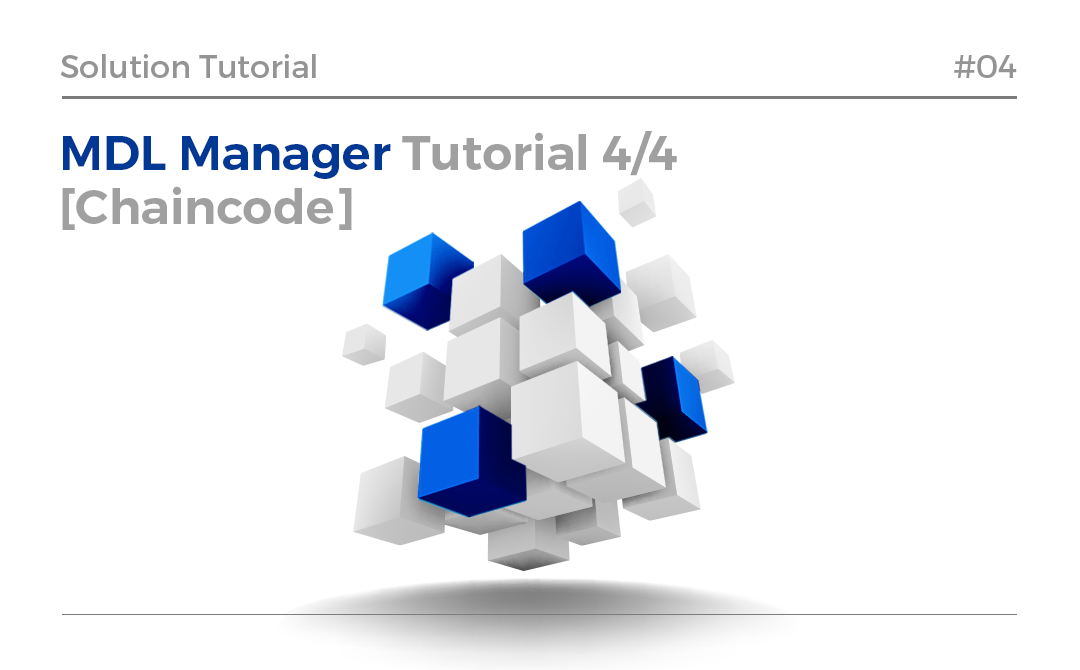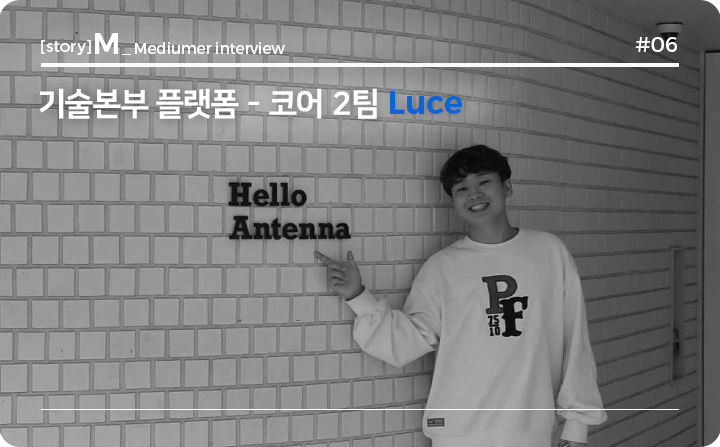비대면 사회와 블록체인 신뢰도의 중요성
이와 같은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권고를, 교육 업계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부 키오스크 기기 도입을 추진하여 비대면 서비스 실행과 함께 교차 감염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초기인 만큼 허점이 존재한다. 바로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그중에 한 사례가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이다.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계좌에 불과하다.
아무리 계좌 개설 과정 중 신분증의 데이터로 본인인증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인증한 것인지, 제3자가 신분증을 탈취하여 인증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한도 제한 계좌로 밖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가 제도권에서 제한 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데이터 신뢰성을 위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는 개인의 신원 데이터를 생체 인증[안면인식, 지문인식] 데이터와 함께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필요시 생체 인증을 통해 암호화된 신원 데이터를 호출하여 은행에 전달한다. 은행에서는 호출된 암호 데이터를 대조하여 진위 여부만 확인한다면 기존의 시스템 대비 효율적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앞의 사례는 블록체인 도입 가능 서비스 사례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도입 추진과 기술의 선점을 위한 블록체인 특허 등록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으며 시중의 각 은행에서는 신원인증에 블록체인 도입과 활용 방안을 밝히며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는 추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과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비대면 신뢰 사회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를 접하면서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영향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접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각기 다른 기업들과 기술자들이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한번 우리의 삶에 녹아든 서비스는 점점 파고들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이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한 변하지 않았으며, 역사는 반복된다.




.png)